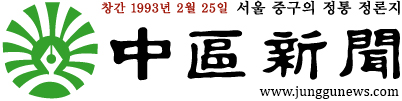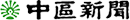스페인에서 온 엽서에는 흰 벽에 햇살이 가득했고 맨 마지막 안녕이란 말은 등짐을 지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는 당나귀처럼 낯설었다. 내 안녕은 지금 어디 있는가 가만히 몸을 만져본다. 두꺼운 책처럼 아무도 오지 않는 저녁 그 어떤 열렬함도 없이 구석에서 조용조용 살았다. 오늘 내게 안녕을 묻는 이의 이름을 떠올린다. 그에게 수몰된 내 마음 보였던가. 구석에서 토마토 잎의 귀가 오래도록 자란다고 말했던가. 내 몸의 그림자는 구석만을 사랑하는지 구석으로만 자란다는 말을 했던가. 내 안녕은 골목 끝에서 맨드라미를 만나 헛꿈들을 귓밥처럼 파내던 날 죽어버렸다고. 물은 결국 말라서 죽는다고 말했던가. 나는 누군가에게 안녕이란 말을 했던가. 더는 물어뜯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던가. 안녕을 묻는 일은 물속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 같다고. 물속에 대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리하여 물속에 혼자 집 짓는 일이라고 말했던가. 안녕, 그 말은 맨발을 만지는 것처럼 간지러웠지만 목을 매고 싶을 만큼 외로웠다고 비명처럼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어느덧 올해의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時)와 공간(空間)을 올해는 어떻게 ‘나 스스로’ 선정하고 편집을 했을까 라고 묻고 싶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승희 시인의 ‘안녕’은 아마도 멀리서 온 엽서에서 시작된 일인가 봅니다. 그것도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온 내용인 듯 ‘~당나귀처럼 낯설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녕은 시인뿐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견뎌내는 우리네에게도 쉽지 않은 명제가 되곤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안녕이란 말을 했던가, 더는 물어뜯고 쉽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던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마지막 인사’를 했던가.
그것은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하듯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한 ‘아픔과 외로움’은 늘상 감기처럼 함께 합니다. 때로 고열로 재채기로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면서 이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도 안녕이란 시간으로 사라지지만 봄이 되면 다시 재탄생하는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11월이 ‘안녕’을 고하기 전에 생각해 봅니다.
김도경(시인, 한국여성문예원 원장)